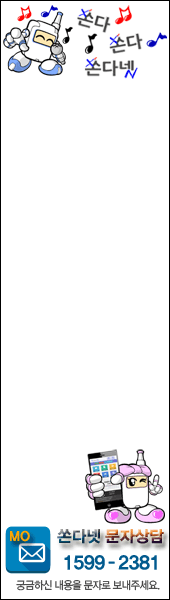역시 일찍 잔 탓에 6시에 눈이 떠졌다.
해운대 바다에 어른거린다.
오늘은 그 어느날보다 날씨가 화창해보여 기분이 좋다.
3일 연속 걸어댔더니 아침에 무겁던 다리도 나름 거뜬하다.
호텔앞 기와집 속시원한 대구탕 집에 들러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들어와 짐을 챙기고 호텔을 나왔다.
부산역에 도착해 짐가방 하나는 보관함에 넣어두고 배낭만 둘러메고 태종대로 향한다.
남포동 갈때 버거웠던 기억에 무거운짐 몇개를 더 빼서 보관함에 넣었더니 한결 가볍다.
태종대에 도착하니 아줌마 아저씨들이 단체로 관광오셨나보다.
한 아저씨는 이미 얼큰하게 취하셨다. 역시 젤로 시끄러웠다;;


1500원을 주고 다누비를 타고 전망대에서 내렸다.
생각보다 볼게 없었다. 한바퀴 휘 둘러본 후 슬슬 걸어서 등대로 향했다.
무한도전에 나왔던 매점으로 보이는 곳이 있기에 그냥 한 컷 찍어본다.
4호라.. 이런 매점이 적어도 3개는 더 있다는 얘긴가.. 이 집이 아닐런지도 모르겠군.. 그냥 패~스


등대.. 그리고.. 시계탑??


불뚝 솟은? 바위 이름이 뭐랬더라? 망부석?? 어딜가나 사연 붙은 돌이 참 많다.. 관심없으니 패~스



등대 입구가 보이길래 들어가본다.
멀미가 날정도로 뺑글 뺑글.. 한참을 돌아 올라가니 역시 무한도전에 나왔던 횟집이 한눈에 들어온다.
평일이라 그런가 몇자리 빼곤 텅텅 비어있다.
이따가 저기서 회 한접시 먹어야겠구나 찜하고 내려왔다.


난간이 있는 길을 따라 들어가니 자살바위가 나온다.
원래 이름이 신선바위였던가? 근데 딱 자살하기 쉽게 생겼구나.. 싶었다.


저기 한 여자애가 사진을 찍으려고 벼랑끝에 서니 뒤에 있던 친구가 그모습을 보고
"야! 너 진짜 자살할려는 애같아 보여 ㅋㅋ" 그런다.
나 저기 끝에 서서 사진 한 컷 찍을려고 그랬는데..
혼자 온 내가 저기 서면.. 정말 그래보일 것 같아 그냥 참았다.

바위가 생각보다 층층이 있어 끝인가 싶어도 내려다 보면 또 넓게 바위가 있곤했다.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는데 배가 지나가니 배를 낚을 것처럼 보였다.^^
아침겸 점심을 일찍 먹은 탓에 출출하기도 해서 횟집으로 향했다.
내려가는 계단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한 아주머니가 나를 향해 손짓을 한다. 먹고가라고..
점점 내려갈 수록 다른집으로 샐까바 바삐 나를 부르신다.
뭐뭐 있냐고 물었더니 해삼 멍게 소라 이런걸 읊어주신다.
회는 없냐고 물었더니 광어 있단다. 아줌마 옆을 보니 광어가 큰게 눈에 띈다.
혼자 왔는데 광어 한마리는 다 못먹지 않냐고 되물었다.
상추에 싸서 먹으면 다 먹는댄다. (사실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회 귀신이라 배가 찢어져도 먹는다)
한마리 하면 얼마냐고 물었더니 2만5천에서 3만원 한다 그랬다. 에이~ 2만원!! 2만원!!
2만원에 합의보고 전망 좋은 자리 잡아 앉았다.



앞쪽 아랫자리에 두명이 앉아 있었는데 왼쪽으로 보이는 젖은 바위가 계속 파도가 쳐올라와 젖은 바위였다.
파도가 크게 칠때 바람이 휙 불면 바닷물이 저자리까지 날리는지 큰 파도 칠때마다 먹다말고 힐끔힐끔 쳐다보더라는..
난 높은자리에 앉아 맘편히 구경해서 좋긴 했는데 앞에 사진에 있던 파란 큰 천막이 바로 뒤에 있어서 그늘이 생겨 좀 쌀쌀했다.
수북이 쌓여있는 회 한접시를 바다보며.. 지나가는 배보며.. 한쌈 한쌈 먹었더니 어느새 다먹었다.
소주 딱 한잔만 있었으면 싶었다. 회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는.. 또먹고 싶다..
따땃하면 좀 앉아서 쉬다 오고 싶었는데.. 점점 쌀쌀해지길래 후다닥 일어났다.
"그거 3만원짜리였어~ 맛있지?? 맛있지?? 담에 또와~" 그러신다.. 언제 또 태종대에 올 수 있을까..

4시를 넘어가니 그림자 위치도 많이 바뀌고 점점 쌀쌀해져온다.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하면서 사진 정리하며 앉아있다가..
열차시간도 있고하니 마무리하고 슬슬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남포동에 들려 못먹었던 먹거리들을 먹고 왔어야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왔드랬다.
찌짐에 오징어무침도 먹고 싶었고, 유명한 씨앗호떡도 먹어봐야 했는데.. 아쉽다.

내가 앉았던 KTX 특실 1인석.. 요 1인석 때문에 특실을 선호한다.. 옆의 2인석에 앉을거라면 그냥 일반실을 탈랜다.
6시45분 열차를 탔더니 내려올때와는 달리 곳곳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
요 KTX는 산천과 달리 역시 넓었다. 그렇다고 산천이 많이 좁은건 아니었지만 산천에 비하면 요놈이 좀 더 넓은 것 같다.
기준은.. 발걸이에 발을 올릴려면 엉덩이를 앞으로 좀 빼야했다.. 내 다리가 짧은걸까 ㅡ.ㅡ
편하게 엉덩이를 당겨 앉으면 발걸이에 발끝만 걸쳐진다.. 쩝..
그래도 특실은 비싼 값을 했다. 편하긴 했는데 한 애기 엄마가 갓난 애기를 데리고 탔는데 서울까지 가는 내내 빽빽거리고 우는 통에 나는 자꾸 잠을 깨서 짜증났고.. 애기엄마는 애기 달래느라 특실 비싼 돈주고 타서도 자리에 거의 앉아 있지를 못했다.
애기 재우느라 이리 저리 돌아댕기고 너무 시끄러울땐 문밖 화장실 앞까지 나가서 애기를 달래곤 했다.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내 잠을 자꾸 방해하는건 너무 짜증에 겨웠더랬다. 편히 자면서 오려고 택한 특실이었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그애기.. 으앙~하고 우는게 아니라 빽!하고 소리를 지른다.. 불만의 표시인가부다. 고놈참..
10시가 다 되어서야 서울땅을 밟았을땐 그저.. 긴 꿈을 꾸다 깬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 확~ 밀려왔다.
처음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을땐 설레임반 걱정반이었다.
혼자 여행을 가본적도 혼자 밥을 먹으러 다녀본 적도 없던 나였기에 마냥 설레면서도 마냥 어색하고 뻘쭘할듯 했다.
막상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을땐 2박3일이 너무 짧았고.. 어색함 뻘쭘함보다 큰 설레임과 신선함이 여운으로 길게 남았다.
그래서 두번째 여행은 고민없이 시작했던 것 같다.
시간과 비용의 고민만 없다면 한달도 일년도 괜찮을 것만 같다.
입에 단내 나도록 조용히 입 꼭다물고 다닌 여행이었지만..
3박 4일 내내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가방하나 메고 낯선 버스에 몸을 싣고 이리저리 사람 구경하며 경치 구경하며..
걷고 싶을때 걷고 쉬고 싶을때 쉬고.. 자고 싶을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때 일어나고..
무엇보다 평일에 내 시간만 있으면 부담없이 떠날수 있는게..
이런게 혼자하는 여행일때 좋은 점인 것 같다.
나는.. 또.. 다시.. 떠나고 싶다..